|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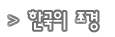
- 한국식 조경은 문헌(文獻)상으로 기록이
될 만큼 많지 않아 조경의 역사적 고찰이 어렵다.
-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의 물질문명 즉,
정치, 경제, 문화, 미술, 공예 등이 중국으로부터 전해 온 것으로 본다면 조경 역시 절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의 영향은 사원(寺院)과
조각(彫刻). 공예(工藝). 미술(美術), 건축(建築) 등에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조경사상(造景史上)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한국은 대륙과 이어진 반도국으로
고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신선설과 음향오행설을 바탕으로 불교와 유교가 종교적 중심이었으므로
한(漢)나라와 진(晋)나라 때 중국 대륙에 성행하던 신선설에 입각한 풍경식 정원이 백제의 궁궐
안에 최초로 축조되었고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은 우리나라 조경의 기틀을 굳게 잡아 놓은 듯하다.
▲ 삼국시대의 조경
- 우리나라의 고대 정원조경을 본다면 민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궁중이나 귀족의 저택에서 볼 수 있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신선설(神仙說)에
입각하여 백제에서는 궁중에 거대한 연못과 섬을 만든 중국의 중도식(中島式)정원의 모방시대가 있었다.
▶ 백제
 |
-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진 사왕 7년에 백제가 궁중을 수리하는데 연못과 산을 만들어 진귀한 짐승과
특이한 화초를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백제 사람인 기사천성이 일본에 가서 오오신궁을
만들었고, 노자강이 일본에 건너가 스이코왕을 위하여 축산식(築山式)정원을 남정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일본의 조경학자인 요코이씨의 [정원발달사]에 기록되어있다. |
- 백제조경의
특징은 사원건축과 그에 대한 조경양식이 두드러지는데 사원에는 불교의 의식에 의해 탑.불상 등
많은 조경적 가치를 지닌 시설물이 이루어졌고 건축부문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고구려
- 강서의 고분과 을지문덕의
묘, 평양의 서교에 위치한 안학궁성지가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974년 안학궁의
발굴로 인해 바다를 상징하는 연못과 방형의 연못이 있었음이 증명되었고 1976년 동명성왕의 대성지를
발굴하게 되었다.
▶ 신라
- 신라시대에는
불교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시기였다. 그것은 경주를 중심으로 건축된 사원과 포석정, 안압지, 첨성대,
음식을 저장해 두기 위한 석빙고, 고분등은 모두 그 시대의 유적으로서 대단한 조경적 업적을 남겨주고
있다.
▲ 고려시대의 조경
 |
-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조경은 불교문화가 준 영향을 건축식 조경으로 변모시키는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귀한 나무와 각종 초화를 심어 재배하였고
고려 후에는 재상이나 귀족들도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
-이와 같이 이미 고려 때에도 누각을 세웠고 청기와나 당종려 껍질을 지붕으로이었으며, 18대 의종은 경기장을
설치했다. 또 충렬왕 34년에는 궁내에 정원사가 있었음을 고려사절요(高麗史折腰)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과일나무를 재상집에 심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흙을 모아 화단을 만들고
세상에서 보기 드문 식물을 심어 감상했다고 한다.
- 이때 정원에 식재된 식물을 보면 국화,
작약, 백일홍, 배꽃, 석류나무, 매화, 해당화, 장미,옥매, 목련, 복숭아, 연꽃, 대나무,
석창포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원을 가꾸기 위한 정원사가 충렬왕 34년(1308)부터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조선시대의 조경
-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숭상하므로 한국적 기후와 풍토에 맞는 색채를 가진 자연 풍경식 조경이 확립되었다고 보겠다.
신선설에 입각한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에 의해 주택지나 우물자리, 산소자리 등을 택하는 풍습이
성행되었으며 신라와 고려의 불교문화가 융합하여 이에 따른 정원조경형태가 발달하게 되었다.
- 초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평화시대였으며
, 숭유배불 사상은 건축양식을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시켰고, 후원형 조경 양식도 전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선시대만큼 뚜렷한 후원양식은 보기 어렵다.
- 그 예로는 경복궁의 후원과 창덕궁의 비원을
들 수 있으며, 건축양식 역시 대비가 강한 색체를 채색함으로써 특이한 색감을 가진 건축이 되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왕궁이나 도읍지, 왕릉, 사원, 가옥, 우물 등은 모두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유교적인 안목보다는 풍수지리설이 적용되었다. 지형에 따라서는 계단을 이룬 노단식 조경(露壇式造景)을
형성했으며, 이때의 건축물의 특징으로는 유연한 곡선으로서 웅장미보다 우아한 멋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후원형의 한국식 조경 (궁중정원)
- 중국의 궁중정원의 영향을 받아 풍수설에
의해 배산임수 지형을 선택하였고 앞뜰보다는 뒤뜰을 넓게 하는데 치중했다. 뒤뜰에는 자연풍경과
각종 식물 기타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앞뜰에는 문무백관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 통로를 평석으로
포장하였는데 이 포장한 양편에는 품석(品石)이 좌우로 세워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 후위에는 자연풍경의 숲 속과 그 속에
여기저기에 누각을 세우고 연못과 정자, 사괴석 등으로 쌓아 올린 계단을 형성한 화단과 그 위에는
목단, 작약, 파초, 홍도, 백도 등의 여러 가지 화목을 심었는데 철쭉과 단풍은 봄과 가을을
장식해 주기도 하였다.
- 궁궐의 지붕4귀의 마루 위에는 여러 가지
동물조각들이 있고 건물 앞에는 사괴석으로 축대를 쌓았다. 건물로 들어가는 통로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 가운데 길은 약간 높게 돌로 깔아 임금이 다녔고, 그 좌우에는 신하들이 통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문도 가운데 문을 크게 만들었고 양편은 작은 문이 있어 동협문과 서협문으로
항상 임금과 좌우에 신하들이 다닐 수 있도록 구분되었으며 대륙적인 장중미(莊重美)가 깃들여 있다.
-
- 궁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경복궁
 |
-
경복궁은 자연에 최대로 적응시켰고 건물배치의 입지 조건과 정신 및 기법은 한국의 조경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의 조경은 중국의 조경을 모방한 점도 있으나 그들 나름의 입지
조건과 국민성에 맞춰서 건축부터 정원조경양식이 모두 독창적이었다.
- 경복궁은 남쪽에 광화문과 북쪽에는 신무문, 서쪽에는 영추문, 동쪽에는 건춘문을
지었고 궁궐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인왕산 절벽과 북악산의 기암 웅봉들이 솟아 있다.
남쪽에는 차경으로 남산의 울창한 노송과 멀리 관악산의 영봉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인왕산
줄기가 좌청룡, 우백호을 이루고 있으며 앞에는 청계천을 연결하는 한강과 이를 가리어
주는 남산이 있어 경복궁은 명당자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
- -
우리나라의 도읍지는 대부분 다 이와 같은 형태이며, 마을의 촌락 형성이나 사원의 위치,
주택지의 선택, 묘자리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경복궁내의 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근정전(勤政殿)을 중심으로 누각이나 정자, 연못, 화단 등이 뒤에 있는 후원형 양식의 조경으로 조선의
궁궐들은 이런 형태였다.
▶ 창덕궁(昌德宮)의 비원(悲願)
- 창덕궁의 비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후원형
조경양식으로 창덕궁과 비원의 총 넓이는 15만평에 달하며 비원만 6만평으로 한국적 멋을 풍기는
노송들과 잡목으로 가득 차있다. 이 비원의 특징은 창덕궁의 후원으로 정무에 시달리던 임금이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며 즐기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소로 자연의 기복이 많은 지형, 지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변화 있고 다채로운 조경을 이룩한 점이다.
- 또한 건물과 연못 등의 인공적 조경은
대부분이 자연 풍경에 흡수시켜 조화되었고 자연미와 인공미는 은근하고 아담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 현대 한국의 정원조경
- 한옥에서 양옥으로 바뀌면서 실생활의
실용적인 기능면과 감상면을 겸한 조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살던 주택의 정원에
영향을 받아 축산식(築山式) 석조(石造)조경양식과 서구의 평면 기하학식 조경양식에서 한국적인
기후와 풍토 시대와 국민성에 알맞도록 자연풍경을 절충하였다.
|